|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 권리 경합
- 일부착오
- 취소 개념
- 민법 107조
- 등기
- 실체관게 부합등기
- 표시행위
- 동기 착오
- 민법
- 법조 경합
- 대표기관
- 사실인 관습
- 원시적 불능
- 소멸시효 완성
- 민법 746조
- 406조
- 406조 효과
- 표시상 착오
- 법정대리권
- 민법상 착오
- 후발적 불능
- 민법 103조
- 민법 의사표시
- 의사표시
- 비법인
- 취소 원인
- 35조 1항
- 108조 2항
- 실종선고 취소
- 취소 효과
- Today
- Total
법학, 민법, 학설, 판례
관습법의 성립요건 및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 본문
관습법의 성립요건 및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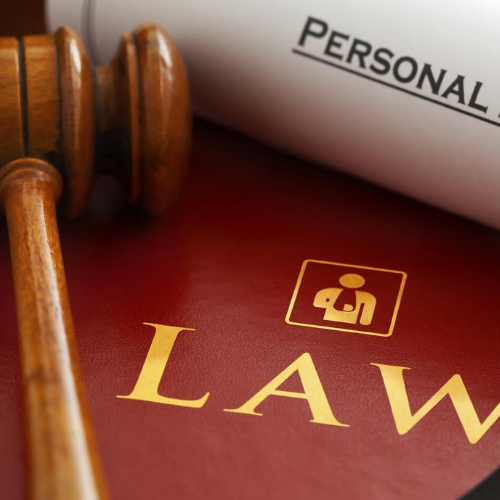
민법은 사적 영역에서의 관계를 법으로 조정하는 법이므로 관습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관습법 역시 사인들 간에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규칙이므로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 모든 관습에 대해서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관습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총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관행의 존재, 두 번째는 법적 확신의 취득, 세 번째는 성립 시기의 문제이다. 관행의 존재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행이어야 한다. 전체 법질서 및 헌법질서, 공서양속에 반한다면 관습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따라서 관습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법적 확신의 취득은 구속력 있는 법적 인식을 말한다. 법적 확신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재판으로 인정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관습법의 성립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통해서 성립한다. 그리고 만약 법원이 관습법이라고 확인한다면 소급하여 관습법을 인정한다. 하지만 법적 확신의 취득이 아닌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판례는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고, 변경 시점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판례 변경을 통해 관습법으로 효력을 부정 사례
판례는 판례 변경을 통해 관습법으로 효력을 부정하기도 한다. 상속회복 청구권 소멸에 관한 종래 관습법 판례와 여성의 종원 자격에 관한 종래 관습법이 대표적이다. 상속회복 청구권 소멸에 관한 종래 관습법에서는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20년 규정을 인정하면 상속인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발생한다는 것을 근거로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였었다. 여성의 종원 자격에 관한 종래 관습법에 관한 판례에서 역시 종래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종래 관습법은 여성의 종원 자격을 부정하였었다. 이 경우는 종래 관습법이 현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종래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고 여성의 종원 자격을 인정하였다. 판례는 조리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이 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인정하면 헌법상 결사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설은 여성이 가입의사의 표명이 있을 때 구성원 자격을 취득케 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
사실인 관습은 민법 제1조와 제106조의 충돌 문제이다. 민법 제1조는 임의규정이 관습법 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조항이고, 민법 제106조는 임의규정 보다 관습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습법과 관습을 같은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 학설은 구별 부정설과 구별 긍정설로 나뉜다. 구별 부정설은 양자의 모순을 인정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입자이고 구별 긍정설은 양자의 모순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해서 보고 있다. 기능상, 주장 입증, 효력 범위에서 각각 차이가 난다고 판시하였다. 기능상 차이는 양자 모두 재판의 자료가 됨은 동일하나 관습법은 법원으로 기능하고 사실인 관습은 의사 해석의 기준으로서 재판의 자료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사실인 관습은 법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장 입증상의 차이는 존부에 대하여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만 사실은 관습은 당사자의 증명이 필요하므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효력 범위에서 관습법과 사실에서의 관습이 차이 난다고 하였다. 적용 영역과 관련하여 관습법은 그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 및 강행규정과 무관하나 사실인 관습은 임의규정인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주류적 판례는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었지만, 일부 판례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자료로서 고려하기도 하였다.
'법학, 민법, 학설,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등기의 추정력 개념과 의의 (0) | 2022.05.25 |
|---|---|
| 등기의 요건과 실체관계 부합등기 (0) | 2022.05.25 |
| 물권법 물건의 독립성 (0) | 2022.05.25 |
| 35조 1항 대표기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0) | 2022.05.24 |
| 대리행위에서의 추인의 법적 성질 (0) | 2022.05.24 |




